‘부’도 ‘명예’도 최고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후보에서 탈락한 가운데, 떠오르는 또 하나의 강력한 후보가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재벌들이 정치적 권력을 얻기 위해 대통령 후보에 나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그들은 자신이 평생 모으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재물을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붓는다. 재벌이야 자신에게 남는 돈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치더라도, 여유가 없는 이들조차 자신의 전 재산을 탕진하며 정치를 하겠다고 뛰어들곤 한다. 심지어 권력을 가진 자들 일부는 자신의 지위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권력을 잃고 난 다음에도 자신과 가족들이 평생 호사를 누릴 만한 재물을 어렵지 않게 축적하기도 한다. 이런 부정을 저지르고도 대형 로펌 등을 활용하여 응당 받아야 할 처벌을 벗어나거나 ‘사면’이란 이름으로 일상으로 돌아온다. 이런 이해되기 힘든 현상을 자주 체험하다 보면 권력이야말로 인생의 ‘최종 목적’, 즉 행복의 가장 막강한 후보가 될 수 있을 듯하다.
선과 악 모두에 관련된 권력
성 토마스는 「신학대전」에서 논박되어야 할 이론 중에 하나로, “행복은 완전한 선인데,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완전한 선이며 이런 것은 권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다”는 주장을 소개한다.(I-II,2,4,obj.2)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을 바치는 목표가 불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면 그것을 ‘최고선’(最高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또는 어떤 사람이 그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타락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행복을 가져온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러한 맥락과 관련해서 토마스는 ‘권력은 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악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기에 궁극적이고 보편적인 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I-II,2,4) 권력을 잘 사용하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만일 그것을 나쁘게 사용하면 최악이므로 권력은 선과 악에 대해 중립적이라는 것이다.(ibid.,ad2)
우리는 우리나라의 길지 않은 민주주의의 역사 동안에, 심지어 최근에 벌어진 계엄 사태를 통해서도 권력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쉽게 공동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권력을 남용해 왔는지를 뼈저리게 체험해 왔다. 심지어 「사피엔스」라는 베스트셀러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민주주의 사회에선 제한된 시간 내에서만 권력을 누릴 수 있기에 인물이나 정당이 권력을 돌려주기 싫으면 빈번히 법을 파괴하곤 한다”고 말했다. 권력층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벌이는 불법행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주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듣다 보면 권력이 선으로 기울기보다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처럼 악으로 기우는 일이 더 많아 보인다.

권력의 무상함을 직접 보여준 보에티우스
추상적으로 들리는 성 토마스의 설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예가 있다. 자기 자신이 직접 권력을 가져봤고, 이를 모함으로 허무하게 빼앗긴 보에티우스(Boethius, 480~524)는 자신의 삶을 통해 권력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준다. ‘인격’ 개념의 정의로 유명한 보에티우스는 로마 최고의 명문 가정에서 태어나 아테네 유학 등을 통해 가장 뛰어난 학식을 갖추게 되었다. 그의 명성이 널리 퍼지자 동고트족의 왕 테오도리쿠스는 그를 발탁해 가장 큰 권력을 부여했다. 그러나 그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올바른 정치를 펼치려 하자, 반대세력이 ‘보에티우스가 동로마 제국과 내통했다’고 모함하며 그를 반란죄 혐의로 고발했다. 보에티우스는 제대로 변론할 기회도 가지지 못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로 파비아의 감옥에서 「철학의 위안」(De consolatione philosophiae)이란 불후의 명작을 남기게 된다. 그 책 안에서 그는 자신을 신뢰하는 척했다가 권력을 잃을까 봐 두려워 어리석은 판단을 내린 왕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한다. 즉, 권력의 허망함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근심의 괴로움과 공포의 아픔도 물리치지 못하는 이 권력이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 신하들을 두렵게 만들면서도 신하들이 자기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신하들을 두려워하여 항상 호위병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 그리하여 그의 권력에 대한 권리가 그를 섬기는 사람들의 의지에 의해 좌우되는 사람을 너는 권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철학의 위안」, 제3권, 산문5)
최고선에 따라야 하는 권력
성 토마스도 권력과 행복이 관련성이 있다면, 어떤 행복은 권력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권력을 덕에 맞게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선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권력을 지닌 자는 공동선에 이바지하기 위해, 그리고 자기 시민들의 덕스러운 삶을 장려하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야 한다.(II-II,47,10) 성 토마스에 따르면, 이렇게 권력이란 최종 목적이라기보다는 올바로 사용되어야 하는 ‘행위의 시원’(principium)이기 때문에 ‘최종 목적’인 행복을 가져다주지는 못한다.
성 토마스는 특히 하느님께만 어울리는 진정한 권력을 인간이 자기 스스로 가진 것으로 착각해서 이웃 위에 군림하고 예속시키려는 태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우리는 여기서 ‘원죄’의 본질이 어떤 계명의 위반이나 육체의 쾌락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인 태도, 독립과 자율이란 이름으로 ‘권력’을 소유하려 함에 있었다는 점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것은 스스로 하느님 없이,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 자신만의 행복을 만들고자 하는 ‘무질서한 의지’(disordinata voluntas)이다.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권력을 탐하려는 인간의 욕심이야말로 하느님을 거스르는 중죄로 떨어지기 쉽고, 이는 불행을 예약하는 행위가 되는 셈이다.
지금까지 행복과 연관해서 살펴본 재물, 명예나 명성, 권력 등은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인간 자신의 바깥에 놓여 있는 선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성 토마스는 인간이 이성과 의지를 통해 행복에 이를 채비를 갖추기 때문에 그의 행복은 외부적 원인에 좌우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이란 우리 자신을 이루는 육체와 영혼에게 좋은 선에 있는 것은 아닐까? 다음 회부터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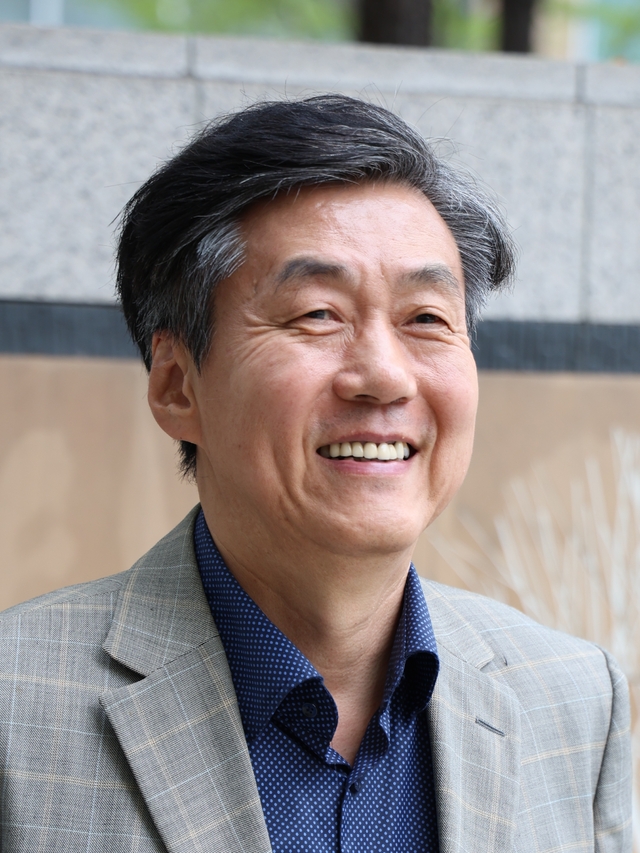
글 _ 박승찬 엘리야 교수(가톨릭대학교 철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