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지하 시인(프란치스코, 1941~2022)을 알게 된 건 고등학생 때였다. 참다운 시 정신을 갈구하기는커녕 백일장을 쫓아다니며 상 타는 재미에 빠진 영혼의 걸인이나 다름없던 시절이었다. 문예부 교실에는 언제 어디서 온 건지 알 수 없는 대학 신문과 노래책이 뒹굴고 있었고, 시화전을 준비할 때면 <아침이슬>이나 <상록수> 같은 노래 사이로 <타는 목마름으로>를 부르고는 했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를 목이 터져라 부를 때면 알 수 없는 희열이 치솟았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인지 야간자습과 입시로부터 해방되고 싶다는 갈망인지 알 수 없었지만, ‘민주’라는 말이 근사해 보였고 느리게 절정을 향해 차오르는 결말부가 비장해서 좋았다. 민주화운동을 하다 여러 차례 투옥되었고, 장기간 옥살이를 했다는 것도 왠지 시인다운 멋스러움으로 느껴지고는 했다.
그를 통해 한 어리숙한 문학청년은 대학에 가면 반독재 민주주의의 투사가 되겠다는 다짐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강의실보다는 거리에서, 시집보다는 화염병과 짱돌과 각목을 드는 날이 많았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와 레닌을 거쳐 온몸으로 대립과 투쟁의 ‘원한학파’(怨恨學派, 헤럴드 블룸)가 되고자 했다.
고(故) 구상 시인(요한 세례자, 1919~2004)을 만난 건 몇 번 참석하지 않은 ‘시창작연습’ 강의실에서였다. 전공필수 과목이기도 해서 집회가 없는 날이거나 숙취가 덜한 날이면 종종 들어가고는 했다. 청춘의 혈기에다 민주 투사였던 많은 동기는 칠순의 노시인이 음송하는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레미 드 구르몽, 1858~1915, 「낙엽」)라는 시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오히려 ”백골단 구사대 몰아쳐도 꺾어 버리고 하나되어 나간다“(<단결투쟁가>)는 노랫말이 더 시적으로 느껴졌다.
그러나 그는 학생들의 결석이나 무관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명시 한두 편을 읊고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슨 골똘한 생각에 빠진 듯 고요하고 느린 시간을 보내고는 하였다. 백발과 소복한 흰 수염은 비껴 내리는 햇살을 받아 더욱 빛났다. 초봄이나 늦가을이면 ‘키로 십자가’와 ‘종로성당’이 새겨진 밤색 카디건을 입은 모습에서 알 수 없는 신비감까지 느껴졌다. 우리는 비록 끓어오르는 열정을 주체하기 힘든 나이였지만, ‘교수님’이 아니라 ‘할아버지’로 호칭하며 존경심을 표하고는 했다.
어느덧 중년 시인이 되어 할아버지의 시를 다시 읽었다. 그는 「나자렛 예수」나 「그리스도 폴의 강」과 같은 작품 말고도 “어제까지 너희의 목숨을 겨눠 / 방아쇠를 당기던 우리의 그 손으로 / 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를 추려 / 그래도 양지 바른 두메를 골라 / 고이 파묻어 떼마저 입혔거니”(「초토의 시 11 - 적군묘지 앞에서」)와 같은 비대립적 평화의 시를 남긴 시인이다. 그가 나의 은사이다.
얼마 전부터 몇몇 연구자들과 김지하 시인의 시와 사상을 공부하고 있다. 그는 이미 청년 시절부터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밝혔으며, 「남녘땅 뱃노래」(1985), 「님」(1995), 「생명과 평화의 길」(2005) 등을 통해 쉬지 않고 생명과 평화를 외쳐온 분이다. 그가 추구했던 길을 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가 나의 길라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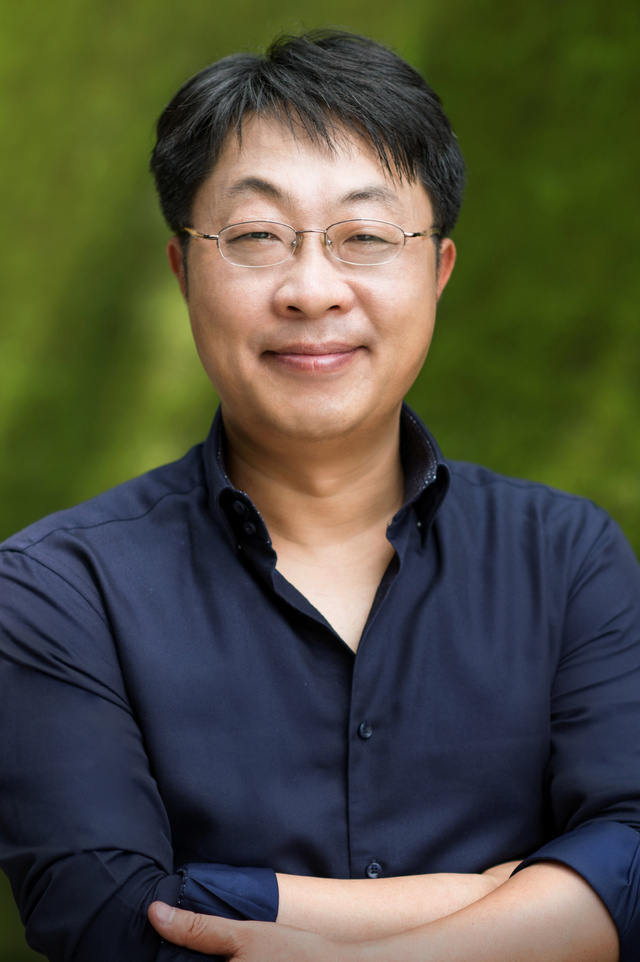
글 _ 김재홍 요한 사도(시인·문학평론가, 가톨릭대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