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현대사의 격변기에 첫 한국인 수도회를 창설한 사제.
한국 고유의 영성을 정립하고 가난을 실천한 수도자.
바로 '하느님의 종' 방유룡 신부입니다.
방 신부의 시복 절차가 교황청의 승인을 받아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방 신부의 고귀한 발자취를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방유룡 신부는 1900년 서울의 독실한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소신학교와 대신학교를 거쳐 30살에 사제가 됐는데, 신학생 시절 강렬한 영적 체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팔종 토마스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
"어느 날 방학하고 와 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나는 수사가 되겠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친구들이 '방유룡이가 아닌데? 이상하다' 그래서 '저 사람은 달에서 노는…' 천상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달에서 노는 사람'이라고 놀렸대요."
나라를 빼앗겨 꿈도 희망도 갖기 어려웠던 일제강점기.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를 이끌었던 시대.
방유룡 신부는 한국인의 심성에 맞는 수도회 창설을 열망했습니다.
방 신부는 본당 사목을 하며 차근차근 꿈을 이뤄나갔습니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 한국순교복자수녀회를 시작으로 1953년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1962년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를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최초의 사제이자 순교자인 성 김대건 신부의 세례명 '안드레아'를 수도명으로 택해 수도 생활에 정진했습니다.
방 신부의 수도 영성은 ‘면형무아(麵形無我)’ 네 글자로 요약됩니다.
<이혜경 수녀 / 방유룡 레오 사제 시복시성 안건 청원인>
"신부님의 호가 '무아(無我)'셨거든요. 자신을 비우고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이 삶을 끊임없이 생각하셨었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면형무아’라는 개념을 만드셨고. 그 ‘면형무아’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신부님의 모든 것들이..."
방 신부의 육성은 1980년 사제수품 50주년 금경축 미사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방유룡 레오 신부>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를 향하여) 우리주 천주께 감사합시다."
한국적 수도 영성의 기틀을 다진 방 신부는 1986년 1월 24일 하느님 품에 안겼습니다.
장례미사는 명동대성당에서 당시 서울대교구장이었던 김수환 추기경 주례로 봉헌됐습니다.
방 신부와 30년 세월을 함께한 이팔종 수사는 방 신부의 마지막 모습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이팔종 토마스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
"아무 것도 없이 돌아가셨어요. 정말 프란치스코 성인 못지 않게 신부님은 아무 것도 없었어요. 있다는 것은 묵주 만드는 집게, 묵주 알맹이. 이건 누구한테도 주장하고 싶어요. 창설 신부님은 정말 하느님의 사람이었다."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본원에는 방 신부의 숨결이 깃든 제의와 손때 묻은 묵주, 평생 착용한 '성모의 사슬'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대교구는 방유룡 신부의 성덕이 한국 교회와 신자들에게 귀감이 된다고 보고 2023년 방 신부의 시복시성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청 시성부는 최근 시복 추진에 장애가 없음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혜경 수녀 / 방유룡 레오 사제 시복시성 안건 청원인>
"방유룡 신부님의 영성의 삶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부터는 정말 세상 안에서 드러내야 되는구나. 이런 초대로 그렇게 소식을 들었다고 할까요. 이런 초대로 받아들여지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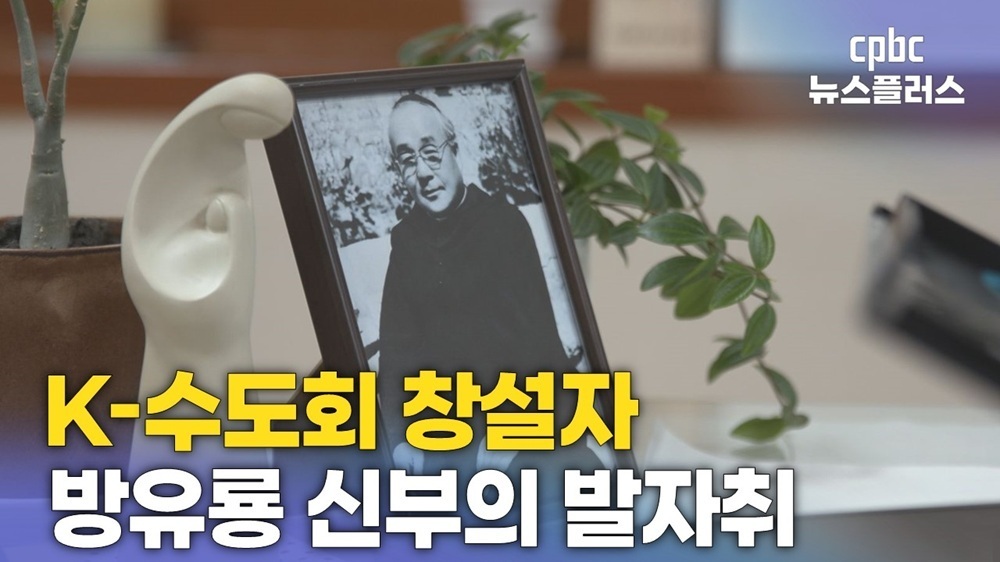
시복 절차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지난달 말 방유룡 신부의 시복시성 기도문과 방유룡 신부의 전구를 청하는 기도문을 인준했습니다.
한국순교복자가족수도회는 12월 8일 창설자 방 신부의 영성을 조명하는 심포지엄을 열 계획입니다.
<이혜경 수녀 / 방유룡 레오 사제 시복시성 안건 청원인>
"널리 널리 방유룡 신부님을 전하게 되고 그분들이 그 영성을 세상 안에서 살다보면 조금 더 이렇게 구체화되지 않을까요. 전구의 기도가, 전구의 명성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은, 기대는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팔종 토마스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
"지금은 우리 신부님만큼 몰입해서 하느님하고 산 사람 나와 보라 그래요. 하하하하."
CPBC 김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