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에서도 고통은 육체적·정신적 차원에서 질병, 실직, 사랑하는 이의 상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렇지만 과거와 달리 과학과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이에 기반을 두고 있는 능력 위주의 산업화 사회에서는 고통을 무조건 없애버리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누구도 고통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많은 사상가가 고통이야말로 인간의 삶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열쇠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한다.
물론 동물의 세계에도 육체적인 통증은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알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뿐이다. 이처럼 고통의 실재는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들에게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만일 삶이 단지 ‘고통의 바다(苦海)’일 뿐이라면, 과연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니체에 따르면 인간이 당하는 고통 그 자체보다도 더 무섭고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 고통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진다는 사실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토마스 아퀴나스는 특수한 정념들에 관한 모든 논의 가운데 ‘가장 적절하게’ 정념이라고 불릴 만한 고통을 매우 길게 무려 다섯 개 문제(I-II,q.35-39)에 걸쳐 다룬다.

고통(Dolor)과 슬픔(Tristitia)의 구분
우선 토마스는 고통(Dolor)을 그 원인이 육체에 있긴 하지만, 영혼의 한 정념이라고 규정한다. 예컨대 손에 화상을 입었을 때 느끼는 아픔과 같은 육체의 상처, 질병 등에서 비롯되는 것이 육체의 정념이라면, 친밀했던 친구와의 이별이나 가족의 죽음에서 오는 비통함은 영혼의 정념이다.(I-II,35,1)
이어서 그는 지성이나 상상력의 깨달음에서부터 오는 정신적 고통에게 슬픔(Tristitia)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부여한다.(I-II,35,2) 슬픔은 단순히 괴로움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성취하려는 어떤 선(善)이 결핍되어 있다고 느낄 때 생긴다. 예를 들어, 중요한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느끼는 낙담은 성취, 자부심 같은 선의 상실에 대한 반응이다.
토마스에 따르면, 기쁨과 슬픔은 그 대상인 선과 악이 대립되기 때문에, 서로 반대된다. 그러나 때로는 그저 서로 다르기만 할 뿐 상호 배척하지 않는 수도 있다. 친구의 죽음은 분명 고통스럽지만, 천상 행복을 누리리라는 영생의 기쁨으로 위로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I-II,35,4)
이어서 토마스는 ‘내면적 고통은, 다만 육체만 아프게 하는 외적 고통보다 더 강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내적 고통을 피하기 위해 외적 고통을 일부러 찾기도 하기 때문이다.(I-II,35,7) 또한 그는 역사적으로 확인된 슬픔의 다양한 종류를 검토하며 그것들이 육체적 고통과는 달리 과거, 현재, 미래의 악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슬픔을 느끼는 역량이야말로 인간됨의 한 조건인 것이다.(I-II,35,8)
삶에 필연적인 고통과 슬픔…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
자기 성찰 계기로 삼는다면…내적 성장 도모할 수 있어
고통의 원인과 결과에 관한 분석
토마스는 계속해서 고통이나 슬픔의 원인을 다룬다. 감각적 욕망을 증가시키려는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이 동시에 슬픔의 원인들을 증가시킨다. 즐거움이 많아지면 불가피하게 그에 반대되는 것도 많아진다. 만일 한 사람이 어떤 선을 상실하고 또 그 손실을 하나의 악으로 포착한다면, 슬픔의 정념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된다.
또한 현존하게 된 악뿐만 아니라, 아직 실현되지 못한 그릇된 바람도 고통이나 슬픔의 원인이 될 수 있다.(I-II,36,1) 특히 정신적인 고통은 우리가 재능이나 노력을 통해서 소유하거나 소유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반대되는 어떤 것에 대한 체험이다.
토마스는 슬픔이 우리의 의지와 사랑에 근거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증오 없이는 고통도 없고 또 사랑이 없으면 증오도 없기 때문에, 사랑(Amor)이 ‘고통의 보편적 원인’이라고 밝힌다.
해로운 것에 대한 욕망, 원하는 선을 얻지 못함, 누리던 선의 상실이라는 세 가지 경우에 갈망은 모두 슬픔을 낳지만, 그 가운데 ‘결합의 욕구(Appetitus Unitatis)’가 특히 강렬하다. 특정 대상과의 결합의 욕구가 클수록, 그 대상이 상실될 때 더 큰 슬픔이 찾아온다. 예를 들어, 오랜 시간 애정을 쏟은 반려동물의 죽음은 짧게 관계 맺은 다른 대상보다 더 큰 슬픔을 유발한다.
더 나아가 재물들을 소유하고 싶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I-II,36,2), 사랑하는 이와 하나로 결합되고 싶은 바람이 채워지지 못할 때도 고통은 발생할 수 있다.(I-II,36,3) 우리의 슬픔은, 우리의 사랑과 미움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매우 소중한 지표다.
이렇게 시작된 고통과 슬픔은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기 때문에, 모든 활동 능력을 위축시키며, 심하면 사람들의 지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다. 감각적 고통이 심할 경우 정신적 능력도 저하시켜 학습 능력이 약화되거나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도 많다. 토마스는 고통과 슬픔을 심장으로부터 오는 생명 운동과 대비시키면서, 다른 어떤 ‘영혼의 정념들’보다 더 육체에 해를 끼친다는 결론을 내린다.(I-II,37)
고통의 성찰을 통한 인간적 성장
이러한 고통과 슬픔의 부정적 결과 때문에 누구나 고통 또는 슬픔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토마스는 슬픔이 올바르게 조절되기만 한다면 상당히 유용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고통의 가장 큰 유용성은 인간의 성찰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해 슬퍼하면 슬퍼할수록, 저 고통 혹은 슬픔을 제거하는 데 성공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한 그것을 제거하려고 더 노력하게 된다.”(I-II,37,3)
고통을 단순히 회피하거나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만 본다면 인간은 내적 성장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반면, 고통의 원인과 구조 그리고 그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단순 회피를 넘어 자기 삶의 근원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신학대전」에 나오는 토마스의 섬세한 연구는 우리를 고통에 관해 성찰하라고 초대한다. 고통 없는 완전한 행복은 이 세상에서는 실현될 수 없으나, 고통을 통해서 인간은 더 온전히 자기 자신을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토마스는 고통의 문제를 피하기보다, 이를 통해 윤리적·영적 성장의 계기로 삼기를 촉구한다. 잃어버린 선에 대하여 괴로워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자기 내면에 선이 남아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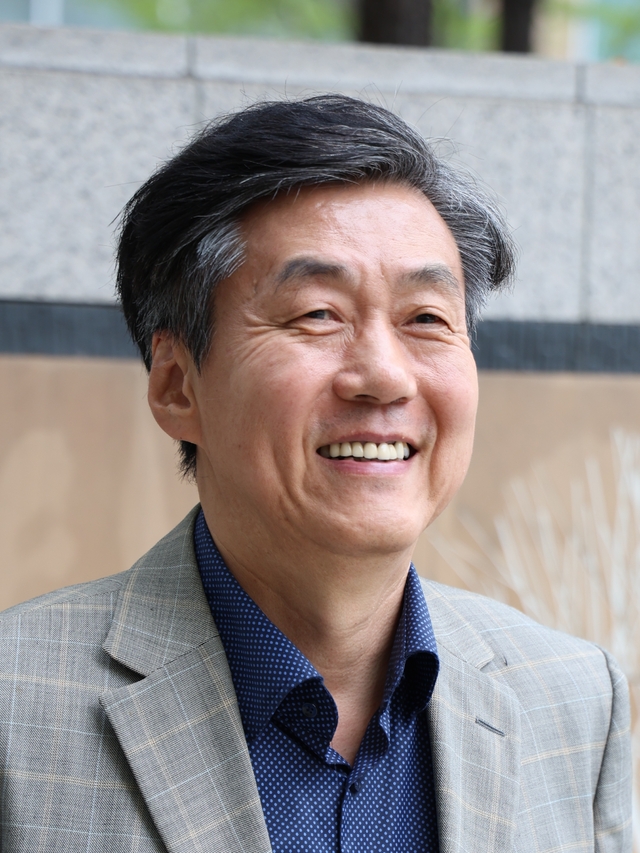
글 _ 박승찬 엘리야 교수(가톨릭대학교 철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