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송사 기상캐스터로 일하던 고 오요안나 씨가 세상을 떠난 지 1년 지났습니다.
하지만 오요안나 씨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미디어 업계에선 여전히 고용 불안과 부당 대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태는 어떤지, 이정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방송작가로 일하던 김서윤 씨.
자랑스러운 일터였지만, 그곳에서 김 씨는 모욕과 폭언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다 하루아침에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서윤 / 전 방송작가>
"너 내 마음, 나를 그렇게 언짢게 했어? 그 다음 날 잘린 거거든요. 이런 식이에요. 그냥 자기 멋대로. 이거는 하루아침에 제 계획과 커리어가 다 무산된 거잖아요. 그 짧은 경력으로 어디 가서 그걸 이력서를 내밀 거며. 자기네들끼리 또 소문을 내요."
김 씨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였습니다.
김 씨 이전에도 프리랜서 방송작가들은 물건처럼 쉽게 교체됐습니다.
<김서윤 / 전 방송작가>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쉽게 자르는데 그게 그 외주 제작사에서 또 저뿐이었냐? 아니요. 그전에 계속 갈려 나가고 제가 들어간 건데 저도 그런 케이스예요."
노동청에 신고해 근로자성은 인정 받았지만, 부당해고는 인정되지 않아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부당해고 구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가능한데, 제작사는 정규직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결국 방송계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괴롭힘과 부당 대우에 더 쉽게 노출되는 상황.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송사 13곳의 비정규직 비율은 66.
미디어 비정규직 노동단체 엔딩크레딧의 올해 3월 조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폭언, 폭행, 부당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자가 75에 달했습니다.
<김유경 노무사 / 노무법인 돌꽃>
"고용 형태상 취약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법령상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고도 사실은 신고를 할 수 없는 그런 상대적으로 정말 약자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고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고 오요안나 씨도 이 구조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괴롭힘 행위는 인정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9년 전 세상을 떠난 고 이한빛 PD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관 /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한빛 PD가) 수시로 행해지는 부당 해고, 노동착취 구조적인 방송의 외주화 등 방송 노동자의 구조적인 문제를 폭로하고 항거한 지 9년이 지났는데도…"
올해 7월 기준 국회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강화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13건이 발의돼있습니다.
쟁점은 '적용대상 확대'로, 프리랜서와 특수고용,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보호범위에 넣느냐 입니다.
<김유경 노무사 / 노무법인 돌꽃>
일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고용 형태랑 무관하게, 일단 다른 거는 좀 천천히 적용이 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근로기준법상에 있는 이 제도 자체는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야 한다.
MBC는 10월 15일 오요안나씨 유족과 기자회견을 가지고 공식 사과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요안나씨가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장연미 / 고 오요안나 어머니>
"이 싸움을 하면서 우리 안나처럼 정말 힘들게 일하면서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는 이유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젊은이들이 정말 많은 것을…"
<김서윤 / 전 방송작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적용이 됐다면 이 사람들도 최소한의 조심은 할 텐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고 그냥 모든 법 위에 본인들이 군림하는 그런 구조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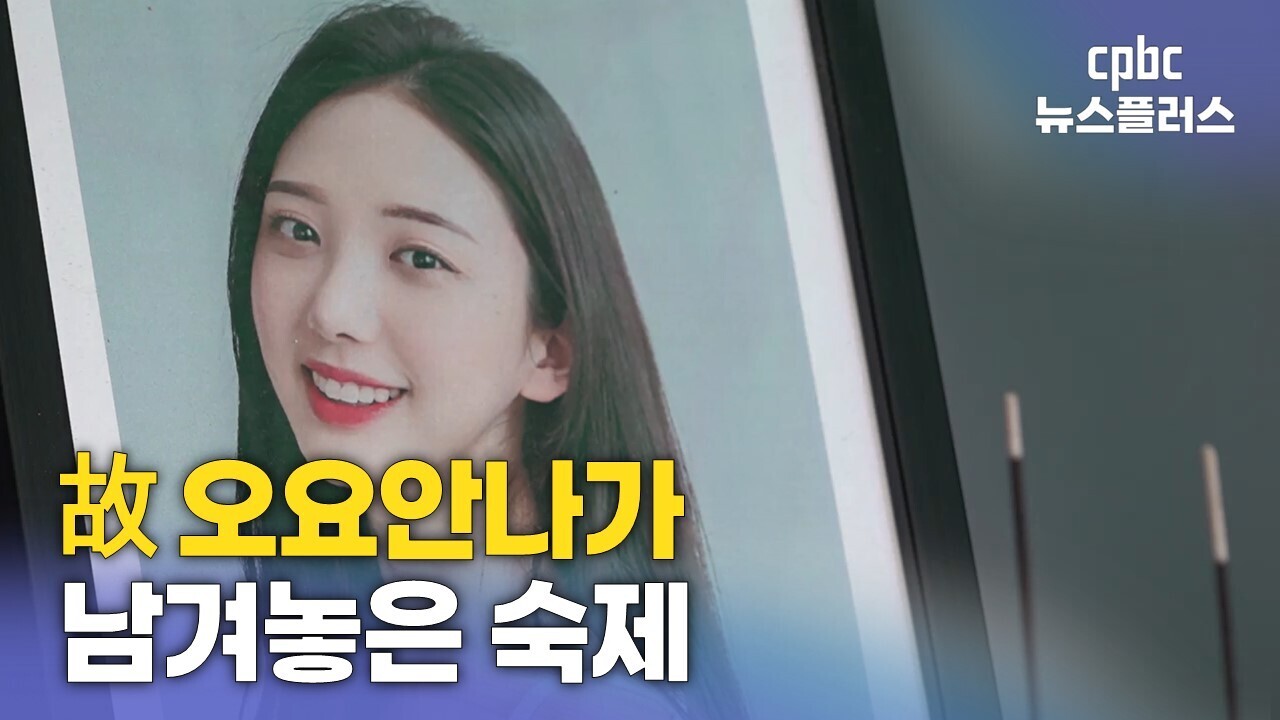
CPBC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