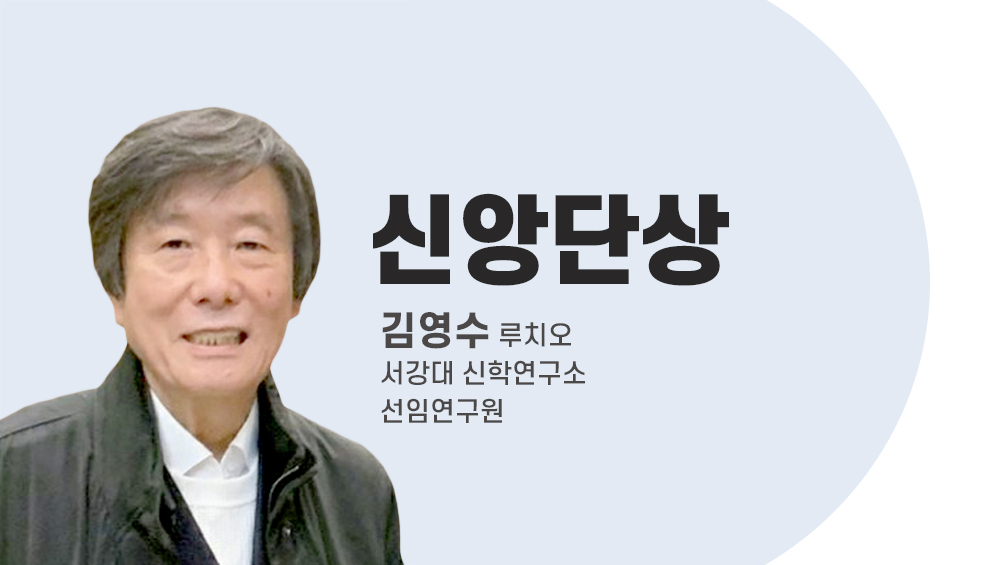청소년 시절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해 결혼 전까지 내 사유의 세계에 특별한 영향을 준 작가가 알베르 카뮈였고, 시지프스는 그런 의미에서 나의 사유의 상징적 이름이었습니다. 결혼 후 바쁜 직장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시지프스는 추억 속의 사유로 밀려났습니다.
그즈음 세례를 받고 가톨릭 신앙인이 되었고 주일은 성당을 찾았는데, 그 동기는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지만, 그때는 더욱 불완전하고 흠 많은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잃고 구약 성경의 욥기에서 욥을 만났습니다. 젊은 날의 시지프스가 그 시절 나의 아픔을 투사하는 이름이었다면, 욥의 고통을 통해 전달되는 아픔은 곧 아이를 잃어버린 나의 아픔이었습니다.
카뮈의 시지프스 신화는 고통에 직면한 무신론자의 입장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지프스는 저승의 신 하데스를 속인 죄로 무거운 바위를 산 정상으로 밀어 올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카뮈는 현대인은 신에게 가중처벌을 받은 시지프스라고 진술합니다. 시지프스는 주어진 형벌을 치르면서 상황을 바꿀 수 없음을 확인하고, 신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산 꼭대기에 바윗돌을 올리는 형벌을 노동 뒤에 오는 즐거움으로 내면적 관점을 전환시켜 버렸습니다.
카뮈는 ‘현대인은 신에게 가중처벌을 받았지만, 내면적 관점을 바꿔 받아들일 때 신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진술합니다. 카뮈는 시지프스를 통해 부조리한 고통이 닥친 인간이 신의 구원을 청하는 대신 저항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느님께 순종했던 욥이 자신에게 닥쳐온 고통 앞에서 하느님께 탄원하는 것처럼 시지프스는 비신앙인의 방식으로 하느님께 저항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직면하여 욥도 시지프스도 저항하지만, 마지막 자세에서 욥과 시지프스는 그리스도인과 무신론자로 갈라집니다. 욥과 시지프스는 둘 다 그들의 고통의 부조리에 대해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도 자기의 고통을 해결할 수 없고 자신만이 고통을 견디어내야 합니다.
많은 철학자와 신학자들은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 고통받는 인간상을 투사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왜 악과 고통을 허용하시는지, 그리고 인간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느님이신지를 질문합니다. 악과 고통의 문제를 해명하는 것은 그리스도 신학의 핵심 과제입니다.
하느님이 인과응보에 따라 보상과 처벌을 하시는 윤리적 하느님이라 믿고 있는 욥의 친구들과 달리 욥은 새로운 하느님을 갈망합니다. 욥은 무죄한 인간의 고통을 구원하는 하느님을 찾습니다. 폭풍 속에 나타나신 하느님은 욥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지만, 사랑의 창조주로 자신을 드러내시며 욥이 스스로 인간이 하느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느님께 순종하도록 이끄십니다. 욥은 하느님과 화해하고 고통을 넘어섭니다. 시지프스와 욥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부조리와 고통을 탈출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먼지와 잿더미에 앉아 참회합니다.”(욥기 42,6) 욥은 우주와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은 인간적 이해와 통찰을 뛰어넘는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욥기는 고난을 당한 뒤 하느님께 저항하는 욥의 모습을 표현하면서도, 한편으로 하느님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고 끝내 하느님 현존과 무상적 사랑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통의 의미에 대한 답변을 구티에레스는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을 사랑으로 계시하기 위하여 기꺼이 버림받고 죽음을 수용하셨다. 십자가에서 예수의 외침은 불의하게 고통을 당하는 이들의 목소리 전체를 대변하는 목소리인 것이다. 인간의 고통을 위한 투신이야말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의 의무이다.”
김영수 (루치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