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PBC 뉴스
○ 진행 : 이혜은 앵커
○ 출연 : 이한솔 /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앵커] 청년들의 주거 문제도 심각합니다.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이한솔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저희가 보통 최소주거기준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의미인데 지금 최소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정확한 용어로는 최저주거기준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이게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연령대의 최저주거기준에 거주하시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어떤 집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청년의 비율이 일반에 비해 2배 정도 높긴 합니다. 한 10 정도요. 그만큼 이제 사회에 진출해서 집을 구해야 하는 여건이 녹록치 못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특히 이 최저주거기준은 사회적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 더 취약해서 반지하 침수라든지 고시원 화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더 다른 문제들을 야기할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긴급하게 해결한 것과 별개로 어쨌든 최저주거기준 이상에 살더라도 사실 적절하게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사는 세입자가 적은 것도 좀 같이 봐야 되긴 합니다.
▷최저주거기준이라는 개념도 짚어주셨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 취약하다는 점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사회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데 생소한 개념이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사회주택이 뭔지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너무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우리가 공공주택이라고 하면 LH 같은 공기업이 짓는 집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해외에서는 LH 같은 공기업 말고도 비영리 민간단체나 노조나 사회적 법인이나 재단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공공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국에 도입이 됐고 한국에서도 민간인데 이제 비영리로 집을 짓고 운영하는 그런 주택들을 통칭에서 사회주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주택이 필요한 이유는 뭔지 궁금하고요. 기존의 공공, 민간 임대주택과 비교를 했을 때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수익을 최대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에서 공급되는 주택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훨씬 더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주택은 아무래도 LH가 공급하는 주택들은 약간 운영 관리가 안 돼서 부실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여기에 공기업의 어떤 폐쇄적인 어떤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사회주택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의 민간 주체들이 있다보니까 각각의 대상자에 맞는 조금 더 특화되고 전문적인 운영 관리와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택이 아무래도 LH 같은 공기업의 공공주택보다는 훨씬 더 운영 관리가 잘 된다고 평가받고 있기도 하고요. 이걸 조금만 시야를 확장해서 보면 기존에는 갭 투기로 인해서 주택이 주로 공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주택은 어쨌든 자본이 들어오더라도 이 집만을 위해서 모델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동산 전체에서도 좀 잘못된 문화나 관행이 바뀔 수 있는 좀 그런 어떤 시도이기도 합니다.
▷ 그러면 전국적으로 사회주택은 얼마나 공급되고 있는지, 그리고 공급 방식이나 입주자 특성 등에 따른 주택유형은 얼마나 다양한지 그것도 궁금하군요.
▶ 지금 7천 세대 정도 현재 한국에는 전국적으로 공급되어 있고요. 사실 특성이라고 하면 좀 말씀드리기 애매한 거는 청년들을 위한 주택도 있고 당연히 노년들을 위한 주택도 있고 다세대 아파트 단지 아니면 리모델링, 빈 집 원룸 쉐어하우스 등 다양한 건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에서 짓는 모든 집의 유형들이 사실 사회주택에도 있는 거고요. 다만 입주자들이 더 안전하고 길게 살 수 있고 저렴하고 좀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커뮤니티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대부분의 유형은 비슷하다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실상 민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든 유형을 사회주택에서도 역시 똑같이 찾아볼 수 있고, 공동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들까지도 제공이 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군요.
지금 사실 집이 재테크의 수단이 된 지가 좀 오래됐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사회주택이 성공을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보시나요?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비영리 주체들이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 여력이 되는 곳들이 적습니다. 초기에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는데 공공에서 적절한 지원을 통해서 비영리로 부동산을 운영하고자 하는 어떤 주체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2만호 3만호 정도 되면서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고 나면 사실 그다음부터는 그래도 새로운 모델로서 충분히 제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네. 사실 충분히 새로운 모델로서 제시가 될 수 있는 여건들은 이미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널리 퍼져야 되는 게 과제일 것 같은데 앞서 보도가 나갔습니다. 깡통 전세 피해 문제를 비롯해서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 보완하거나 혹은 혹은 획기적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계속적으로 민간의 어떤 투기 모델을 편승하면서 정책들이 짜여진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깡통 전세나 이런 문제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사실 국가가 정책을 펼칠 때에는 조금 더 어려운 청년들을 중심으로 점층적으로 쌓아야 되는데 지금은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지원하거나 목돈이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정책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집을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한테 공공주택을 더 적극적으로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이들이 조금 더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비 지원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깔렸어야 되고 더 적극적으로는 사실은 깡통 전세 이런 문제들이 터졌을 때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들을 특별법이나 이런 형태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사실 오히려 더 필요한 사람들은 약간은 외면한 채 조금 더 낮은 청년들을 위한 주거 정책이 펼쳐지다 보니까 지금 그래도 한 10년간 약간의 소득 성과는 있지만 한계도 많이 보여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네. 그 한계 때문에 사회주택이 결국 등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립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이 무엇인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이한솔 이사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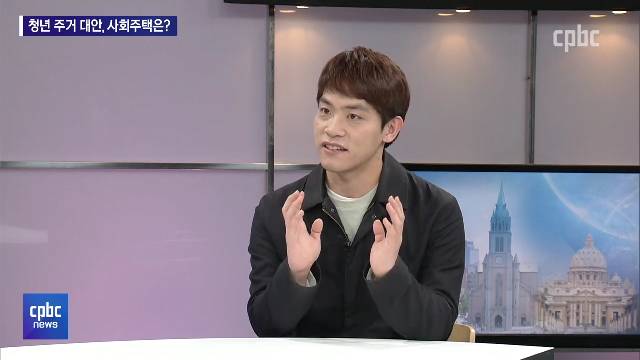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