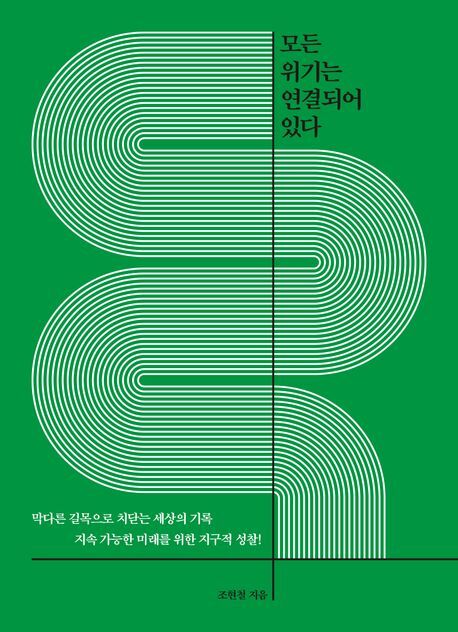
“사람이 죽고, 죽고, 또 죽습니다. 위기의 시대, 너도나도 진단과 대책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근원을 직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회피합니다. 우리의 진짜 위기는 문제의 근원을 보지 않으려는 데 있습니다. 출산과 자살, 불평등, 기후와 농사, 전쟁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에 대처한다며 바삐 움직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꼴입니다. 시간은 가고 상황은 나빠집니다.”(7쪽)
예수회 사제로 교단에서, 생태환경 현장에서 쉼 없이 활동해 온 학자이자 활동가 조현철(프란치스코) 신부는 소비와 성장의 증대, 기술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역설한다. 대안은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 삶, 자족하는 삶, 불편한 삶을 사는 것이다. 하지만 너무 이상적이고 급진적인 주장으로 들린다.
이런 의견에 대해 저자는 “그것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현실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코로나19, 기후위기는 지금의 체제와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지구 환경의 위기는 결국 노동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인간의 위기로 이어진다. 이유는 지구 위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기도 하지만, 하나의 거대한 체제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 현실 앞에서 삶의 변화를 꾀하지 않는다는 것이야말로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강조한다.
책은 지난해 봄 교단에서 물러난 후에도 녹색연합 공동대표, 비정규 노동자 쉼터 ‘꿀잠’ 대표, 예수회 사회정의생태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조 신부의 생태 산문집이다. 총 2부 10장으로 구성돼 환경과 노동, 생태적 가치관으로의 회심(metanoia)을 주요 주제로 다룬다.
그간 ‘경향신문’과 ‘녹색평론’ 등에 연재 기고해 온 글들을 추리고 수정, 보완했다. ‘세상을 읽는 예리한 공적 시선에 개인적 경험과 관찰이 잘 어우러져 신선한 사회적 에세이가 탄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칼럼 형식이다 보니 어렵지 않게 읽으면서도 있는 그대로의 생태 위기 현주소를 알게 하고, 텃밭을 일구며 적은 ‘텃밭 일지’ 등은 직접 자연의 힘을 체험하려는 소소한 노심(勞心)으로 다가온다.
엮는 과정에서 ‘나는 왜 쓰는가?’라는 물음을 던졌던 조 신부는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쓴다’는 답을 얻었다.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무엇이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중 하나가 글쓰기였다’고 토로한다. 자기 한 사람이 목소리를 낸다고 세상이 얼마나 바뀔지 회의에 빠지기도 했지만, ‘성경의 선지자들 역시 힘없고, 무명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힘을 냈다고 고백한다.
책은 분열과 파편화의 시대, 생명의 연대를 회복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일깨운다. 놀랍고 신비로운 구원의 비결이 아니라, 그저 현실을 위해서는 우리 행동이 필요함을 힘주어 말한다.
전 제주교구장 강우일(베드로) 주교는 추천의 글에서 “예언자적인 글을 읽으며 그릇된 욕망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성장 이데올로기에 중독된 현대사회의 오만과 무신경을 새삼 안타깝게 느낀다”고 밝히고 “생명의 존엄과 사랑의 정신을 회복하는 길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깨닫는다”고 말했다.